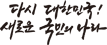수년 전 남편의 근무지를 따라 대전의 내동에서 산 적이 있다. 처음 그 집을 보러 갔을 때, 나의 발길을 붙잡았던 것은 집 앞 길을 따라 배경 미터쯤 펼쳐 있는 녹지였다. 사실 녹지라기에는 품격이 좀 떨어지는 모양새였다. 아파트 담장 밑으로 흙을 돋우어 만든 경사진 둔덕에 잡초와 칡넝쿨이 어지럽게 엉켜 있고, 사이사이로 온갖 생활 쓰레기가 몸체의 일부만을 가린 채 숨어 있었다. 쓰레기야 치우면 되고, 도시에서 이만한 녹지를 만나기 쉽지 않거니와 마당 넉넉한 단독 주택의 아래층도 아주 매력적이었다. 그 집은 니은 자형 양옥으로 이층에는 갓난아기를 둔 새댁이 세 들어 살고 있었다.
이사를 한 후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녹지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었다. 대형 쓰레기는 신고를 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소형 쓰레기들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고, 썩은 나무나 종이류는 소각했다. 혹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눈에 띄면, 불러서 회수해 가도록 하였고, 쓰레기 처리를 잘하자는 홍보 문안을 녹지 옆에 위치한 가구들마다 일일이 돌렸다.
과연, 극성을 부린 보람이 있었다. 달포쯤 지나니 볼품없던 풀숲이 반짝거리면서 제법 눈 요기가 되었다. 분주한 사이 계절이 바뀌고 붉은 칡꽃이 피기 시작하니 초록 일색이던 풀숲에 귀여운 악센트까지 생겼다. 그 무렵 새댁은 아기가 꿈을 꾸는 동안 종종 커피를 타가지고 마당으로 내려왔다. 우리의 대화 내용은 다양했지만, 나의 녹지 복원에 대한 과찬과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씹는 일도 빠지질 않았다. 녹지가 아파트 담장을 낀 한산한 길옆이다보니,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영장동물이 끊이질 않았다. 그래서 복원에도 적지 않은 노력이 들었지만, 유지하는 데도 만만치 않은 공이 들었다. 항상 대문 옆에 목장갑과 비닐 봉지를 걸어두고, 들며날며 풀숲의 쓰레기를 주웠다. 당시 초등학교 일 학년이던 어린 딸도 신주머니에 쓰레기를 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반드시 좋았던 것만은 아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다 충고를 들엇던 이웃들은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 눈치였다. 오직 새댁만이 진정한 나의 아군이었다. 그녀는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을 보면 신속히 나에게 알리고, 몰래 버린 쓰레기의 주인을 찾는데도 많은 정보를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침입자는 예고도 없이 나타났다. 그 사이 나의 녹지는 '근화원'으로, 내도 집은 '근화정'으로 승격이 되어 있었다. 이사 간 이듬해 봄, 모 신문사로부터 고맙게도 나는 무궁화 100수를 얻어 마당 가득 무궁화를 심고, 녹지 주변을 무궁화로 치장할 수 있었다. 근화정의 변화에 대해 집주인도 좋아하였고, 무엇보다도 내가 신이 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랑을 일삼으니, 나중에는 나의 지인들이 그렇게 불러준 이름이다. 이렇게 근화정과 근화원의 안주인으로 유유자작하던 나의 잔잔한 일상에 갑자기 누가 철퇴를 내리친 것이다.
"언니, 언니, 큰일 났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이른 아침, 거의 비명에 가까운 새댁의 소리르 듣고, 놀라서 문밖으로 뛰어나온 나는 다시 한 번 또 깜짝 놀랐다. 하룻밤 사이에 좋던 황금물결이 시커먼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거짓말처럼 훅~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리고, 아.... 검은 뼈로 서 있는 나의 무궁화... 잔인한 광경에 말문이 막힌 나는 하릴없이 눈물만 흘렀다. 탐문을 해보니 어떤 오십 줄 여자가 불을 놓고 갔다고 한다. 이 난데없고 경우 없는 침입자는 얼마나 신출귀몰한지 오고 가는 행선도 없이 왔다간 흔적만 남겨 놓았다. 한동안 시커먼 재를 날리며 방치되어 있던 공터가 조금씩 일구어지더니, 때마다 땅속에서 나온 쓰레기들이 길 쪽으로 버려졌다. 알고 보니 김장할 무와 배추를 심어 먹으려고 하는 짓이었다.
'어떤 철판인지 만나기만 해보라!' 이를 갈며 가슴을 쓸며 벼르고 있던 나는 드디어 씨를 뿌리러 온 침입자를 만났다.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따지자, 침입자는 너무나 당당하게도, 이것이 네 땅이냐, 무슨 상관이냐, 쓸모없는 풀떼기 대신 푸성귀라도 뽑아 먹으면 좋지 뭐가 잘못이냐, 동네 사람들이 시어머니 하나 생겼다고 하던데 네가 바로 그 잘란 오지랖이냐며, 허공에 지휘를 해댔다. 분한 만큼 나의 기세도 등등하였으나, '시어머니' 대목에서 맥이 빠져버린 나는 그만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다.
그래도 한 번 더, 녹지를 훼손하는 짓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반격하였다. 땅 좁은 대한민국에서 땅을 놀리는 것은 더 큰 죄라면서 애국자 행세까지 하였다. 상대는 무적의 철면피였다. 침입자에게 남의 입장이란 쉽게 걷어낼 수 있는 거미줄에 불과했다. 오냐, 독거미 맛을 한 번 봐라! 대문을 부서져라 닫아버리고 퇴각하면서 나는 속으로 부글부글 독기를 품었다.
그날 밤, 나는 복수전을 감행했다. 작전명은 '눈에는 눈', 작전의 관건은 쥐도 새도 모르게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드디어 남편과 딸도 곤히 잠들었다. 행동 개시!
손전등을 켜고 가스레인지의 스위치를 누르자 ' 뜻뜨뜨'소리와 함께 복수의 칼날이 파랗게 피어올랐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내 사랑 녹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끓인 물을 들고 문밖으로 나오니 시커멓게 누워 잇는 공터 위로 괴괴한 기운이 감돌았다. 주위를 둘러본 후, 나는 우선 손쉬운 아래쪽부터 작전을 실행했다. 이놈의 씨앗들, 뜨거운 맛 좀 봐라! 흥, 백날을 기다려 보시게, 싹이 트나! 나는 씨앗을 심어 놓은 자리 위로 펄펄 끓인 물을 모질게 하나, 독하게 둘붇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게 끝이었다. 복수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다시 물을 부으려는 순간, 땅속으로부터 씨앗이 냄직한 신음 소리가 들려왔다. 부질없는 미친 짓이었다. 결국 이 작전의 관건은 바로 내 마음의 눈이었던 것이다. 나의 복수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공터에는 제법 먹을 만한 배추와 무가 쑥쑥 자라기 시작했다. 가을 내내 싱그러웠던 풀꽃 향기 대신 진한 거름 냄새가 바람에 실려 왔다. 김장 농사는 성공적 이었던 모양이다. 수확을 하던 날, 공터 옆의 집집마다 서너 포기의 배추들이 전달되었고,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는 문 앞에 놓여 있는 전리품을 도로 배추 껍질이 어지러이 널려 있는 빈터에 가져다놓았다. 그것은 나의 근화원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였다. 그리고 곧, 녹지를 잃은 나는 미련 없이 내동을 떠났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