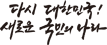맥없이 무너진다. 서슬 퍼런 전기톱이 굉음을 내지를 때마다 떨어지는 허연 살점들이 눈물을 쏟듯 한다. 백년해로한 노부부처럼 유치원마당을 지키던 은행나무가 사라지는 순간이다.
온 하늘을 떠받치고도 의연하더니 이젠 추수 끝난 빈들에 누운 짚동처럼 나동그라졌다. 사지를 버둥거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그 소리마저 무지막지한 기계소리가 삼켜버린다. 새파랗게 질린 잔가지가 어지럽게 널려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리 무성한 나무를 왜 베느냐고 묻지만 어느 누구도 대답이 없다.
유치원 창문으로 내다보는 아이들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어 나는 가게 문을 다고 애써 모른 체 한다.
갓 돌이 지난 아이를 업고 낯선 마을에 첫발을 들이는 우리 가족을 맨 먼저 반가이 맞아 주었던 이가 은행나무 부부였다. 짙은 그늘아래에서 땀을 식히며 우리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나무 그늘의 끝자락에 작은 사진관을 차린 것이다.
나무는 내 아이의 서툰 걸음을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빛으로 내려다보았고, 젊은 나이에 사진관을 운영하는 나를 엄마처럼 지켜보았다.
경험이 없어 손님을 대하는 일에 지쳐 울먹일 때면 처음엔 다 그런 거라며 힘을주었다. 얼토당토않은 언쟁이 있을 때면 괜히 나무에게 화를 내곤 했다. 여름이면 은행나무의 부채바람에 잠을 재웠고, 가을이면 화르르 떨어진 수북한 은행잎을 이불 삼아 깔깔대며 구르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 나무 아래는 우리 집 마당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무 곁에 유치원이 생기자 나무는 더욱 활기차 보였다. 주변에서 이처럼 큰 나무는 흔치 않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는 그곳은 쉴 곳이 마땅찮은 동네의 유일한 휴식처였다.
곧고 튼튼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의 표본이 되었고 술래잡기 놀이에 버팀목이 되기도 했다. 마음이 고달픈 사람은 시름을 내려놓고, 젊은이들은 사랑의 꽃을 피우며 미래를 꿈꾸던 곳이기도 했다.
참새도 쉬어가고 비둘기도 놀다갔다. 까치는 수없이 둥지를 틀었다. 삼십 년이 되도록 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 친정 엄마처럼 지금까지 내 곁에 남아 있던 나무다.
그 나무가 잘리게 된 것은 그늘이 넓은 탓이다. 가지가 우거져 옆집 담을 넘었다. 옆 상가는 낡아서 지붕에서 빗물이 줄줄 샜다.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지붕을 고쳐 달라고 했지만, 주인은 머지 않아 허물고 새로 지을 것이라며 지붕에 비닐을 덮어놓았다. 그리고는 유치원에 가서 나무를 베어달라고 요구했다.
유치원에서는 큰 나무를 베기가 아까워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만 몇 번이나 베어냈다. 한쪽 가지만 쳐내니 몰골이 꼭 해풍 맞은 솔 같았다. 그럼에도 잎이 자꾸 떨어져 자기네 건물에 쌓여 물이 잘 빠지지 앟는다며 구청에 진정서를 여러 차례 냈다고 하더니 이렇게 되고 말았나 보다.
환청일까. "재재재재'새들이 지저귀고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어느새 잔가지까지 정리되었는지 그 많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뙤약볕 아래 솔개 그늘 한 점 마저 없는 놀이터는 조용하다 못해 휑하니 적막만 돈다.
나무가 서 있던 자리에는 동그마니 백짓장 같은 등걸에 나이테만 뚜렷하고, 설자란 은행꼬투리가 낙태 당한 태아처럼 떨어져 있다.
나무가 없어지니 놀이터 담벼락에 그려놓은 동물캐릭터 그림이 선명하다. 그네를 타는 다람쥐 토끼가 밀어주고 있다. 아기 곰 두 마리는 어깨동무를 한 채 노래를 하고, 아기코끼리는 그 모습을 보며 웃고 있다. 눈이 쭉 찢어진 여우 한 마리가 토끼에게 팔을 뻗고 있다. 여우의 간교한 웃음에 시선이 머문다.
어린이와 나무는 우리의 미래다. 이제 아이들은 어디에서 자연의 향기를 느끼고 풍경을 그릴 수 있을까. 사람에 의해 베어진 나무는 어느 누군가의 보금자리를 훈기 있게 해 줄 것이다.
자기에게 이익이 없고 불편하다고 여러 사람의 희망을 앗아가는 인간의 이기심이 가슴 아프다.
수업이 끝났는지 우르르 아이들이 밖으로 나온다. 살아온 세월을 말하는 나이테가 말없이 아이들을 맞이한다. 나무의 흔적을 찾던 아이들의 엉덩이가 옹기종기 그곳에 앉는다. 아이들은 갑자기 사라진 나무를 어떻게 생각하고 선생님은 뭐라고 설명을 할까. 출근할 때마다 나를 반기던 까치는 어디로 갈까? 아직도 나무와 못다 나눈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
봄이 빨리 기다려진다.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재잘대는 소리에 땅속 깊이 잠자고 있던 뿌리에서 새싹이 기지개 켜며 연둣빛 주둥이를 내밀지 않으려나.
여름 햇살이 참 오지게도 뜨겁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