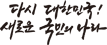그해, '병가(病暇)'라는 남루한 시간 앞에 서 있었다. 일상의 삶을 가로막은 아스라이 높은 통곡의 벽이었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암수술을 받고 퇴원한 직후였고, 몇 개월 뒤엔 대대적인 종합검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공포감은 시시때때로 목을 조이며 달려들었다.
어느 순간 피하지만 말고, 직면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계족산의 황톳길을 걸어 보기도 했다. 최소한 내 나이 수만큼 다녀오자고 목포를 세웠다.
헉헉거림 계족산에 오른다. 산줄기가 닭의 발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기에 유래된 이름이다. 어떤 마음이 서한 기업가가 계족산의 임도에 15t 트럭 100여대 분의 황토를 사다가 쏟아 부었다. 촉촉하고 아늑하여 매날로 걷기에 적합한 계족산의 숲속 황톳길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계족산성을 정점으로 산의 팔부능선을 휘감아 도는 널찍하고 순탄한 길이다. 13km 트랙 한 바퀴를 도는 데 5시간이 소요된다. 혼자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마음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호젓한 숲길이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마음에 맺혀 있던 쓰라린 감정들이 무의식의 빗장을 풀고 쏟아져 나온다. 그럴 때 초록의 숲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범벅인 어깨를 토닥거리며 위무한다.
'괜찮아, 괜찮아. 다 지나가. 지나가는 거야.'
숲길을 걷는 걸음 위로 하얀 구름이 흘러간다. 수십 굽이를 돌아오는 청아한 산바람을 맞는다. 이야기들을 나누느라 수선거리는 숲과 새 소리를 들으며 걷는다.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마을이 보인다. 한참을 걷다보니 전망이 확 트이며 저 멀리 대청호수가 파랗게 펼쳐진다.
닭 발가락은 앞발가락과 몸을 받치는 역할을 하는 뒷발가락으로 되어 있다. 닭의 뒷발가락처럼 남에게 선뜻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다. 그것은 재판상 이혼이다. 한 순간에 삶 전체가 풍지 박산이 되는 참혹한 과정을 겪었다. 내게 남겨진 두 아이와 직장 일에 치열하게 몰두했다.
하지만 피를 말리며 주저앉게 만들었떤 끔찍한 고통은 사춘기 시절의 비행 청소년이었던 아들이다. 오토바이 질주, 흡연, 음주, 폭력사건,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 등 일탈 행동은 끝없었다. 사고를 저지를 때마다 불러갔다. 어느 장소에서든 못난 어미로서 무릎을 꿇엇다.
"제 잘못입니다.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십시오."
내 눈물을 지켜본 아들은 서서히 마음을 잡고 돌아왔다. 머리를 깎고 전심전력으로 공부하여 수의대에 진학하였다. 지금은 수의연구사가 되어 있다.
계족산성에서 눈부신 풍광을 내려다본다. 따뜻한 햇볕을 쬐며 성벽에 기대어 앉아 휴식을 취한다. 비로소 인생에서 이미 벌어진 일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깨달음이 온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고달프 속에도 깊숙이 숨겨진 희망을 만날지도 모른다. 불안함을 털어내면서, 한여름 뙤약볕과 몰아치는 폭우 속에서도 걷고 또 걸었다. 어떤 날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이 자욱이 피어오르는 깊은계곡의 운무에 갇혀 허우적거리기도 했다.
숲길을 돌다가 저절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 산 벚나무는 숲길 트랙의 마지막 지점쯤 길모퉁이에 심하게 굽어 용트림하며 가로막듯이 서 있다. 볼때마다 안부를 묻는 심정으로 우툴두툴한 검은빛 표피를 쓰다듬는다. 첨음 만난 날, 누군가 방금 생가지를 꺾어냈는지 생살이 허옇게 찢겨져 처참한 모습이었다. 흘러 넘치는 옹이의 진액은 꾹꾹 참다가 흐르는 그렁그렁한 눈물 같았다. 그 피폐한 몰골이 나와 같아서 망연히 서있었다.
직장 동료들은 승부욕이 강한 나를 '여전사(女戰士)'라고 불렀다. 승진은 코앞에 있었다. 가장 어려운 보직이 맡겨졌다. 성공리에 완수하고자 불철주야 매진했다. 이런 오만한 모습들이 신의눈에는 거슬렸던 것일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 멈추어서게 되었다.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예상치 못한 갑상선암이 발견되어 수술했다. 불행은 혼자서 오지 않았다. 6개월 뒤에는 유방암이 판독되었다. 눈앞에 펼쳐지는 믿지 못할 상황에 병원을 서울로 옮겨보았다. 도대체 무슨 조화일까. 암수술을 마치고 방사선 치료를 받던 도중 이번에는 뼈 전이가 된 것 같다고 흉부외과에서 수술을 하잔다. 수술 결과는 다행히 양성 낭종이었다. 갈비뼈를 숟가락으로 박박 긁어대는 듯한 통증으로 진통제와의 사투가 시작되었다. 끝내지 못한 전쟁이었다.
숲에는 치유 능력이 있다. 에코 힐링(eco-healing), 자연을 통한 심신의 치유를 의미한다. 억겁의 세월이 만들어낸 숲에는 피톤치드와 테르펜 등 인간의 세포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성분이 풍부하다. 숲길 걷기를 서너 달 정도 했을까. 차츰 마음의 화평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결박하고 있던 번뇌를 하나씩 풀러 내려놓으며 마음을 비워갔다. 사실 아픔과 흔들림 없는 완벽한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 다독인다.
단풍 절정인 계족산이었다. 끝을 향해 색이 바래져가는 가을 숲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타박타박 걷는데 문득 불어온 바람에 낙엽들이 폭포처럼 솓아져 내렸다. 신의 장엄한 강복기도 같아서 온몸으로 맞으며 한참을 서 있었다.
마지막 바퀴를 돌던 겨울날이었다. 걷는 발자국마다 소복소복 눈이 덮였다. 길게 펼쳐진 한 장의 수묵화 속에 서있다. 마음은 고요 속으로 침잠했다. 어쩌면 인생이란 이 흩날리는 눈발처럼 순간의 반짝임이리라. 그때였다. 등 뒤로 후다닥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내 곁을 빠르게 지나쳐 하얀 눈 속으로 달려가는 사슴을 보았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었다. 순백의 세상에서 만난 사슴은 상서로운 징후였던가. 며칠 뒤, 가슴 졸이며 실시했던 종합검진에서 건강 판정을 받았다.
산다는 것은 별게 아니다. 인생은 그다지 슬플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다지 기쁠 것도 없다.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나름의 작은 '화평(和平)'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다. 내가 선택한 화평의 방법은 계족산 숲길걷기였다. 느릿느릿 걸었던 걸음 위로 바람이 지나가고, 구름이 흘러갔다. 나를 돌아보았고, 삶을 바라보았다. 이 과정에서 살아가며 진정 포기해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는 순간 우울하고 암담했던 병가는 평온한 '안식년'으로 바뀌었다. 계족산 황톳길에서 심신이 치유된 나는 직장으로 복귀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혹 당신도 지금 인생의 여정에 지쳐서 고단한가. 그렇다면 산으로 가보라. 어떤 산이든 상관없다. 당신이 도착한 그 산의 싱그러운 숲속 길을 느릿느릿, 될 수 있으면 더 천천히 걸어 가보라.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