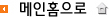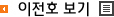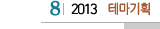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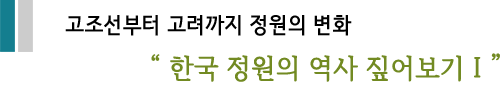
-

부분 정원의 역사는 물리적인 형상과 객관적인 사실에 천착하다 보니 정원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는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 정원을 생산하고 소비했던 동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추적해야 하고, 그 정원들이 어떠한 용도의 공간이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각기 다른 정원들이 일상과 문화 속에서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가를 해독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정원"의 의미를 되짚어보기 위해 고조선에서부터 현대까지 한국 정원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 역사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번달 웹진에서는 고조선에서부터 고려정원까지 살펴보겠다.

-
고조선(BC. 2333 ~ BC. 238)
- 고조선 시대에는 노을왕이 유를 조성하여 새와 짐승을 키웠다고 한다. 이 시기의 경우 과실수나 채소류, 화목류 등을 옮겨 심어 주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초기의 자연 정원이라 할 수 있다.
-
삼국시대
- - 고구려(B.C. 37 ~ A.D. 668)
고구려 장수왕 2년(AD 427년)에 만든 안학궁 남궁 서쪽의 정원은 자연곡선형 연못과 인공적인 축산, 연못 내에 3~4개의 섬이 있는 비정형적 자연풍경식 정원 특색을 보인다(윤국병, 1985). - - 백제(B.C. 18 ~ A.D. 660)
삼국 중 조경문화가 가장 발달하여 일본 아스카시대 문화에 강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신선정원의 조성 기법을 받아들여 큰 연못 한 가운데에 방장선산을 쌓았으며, 부여 유구로 남아있는 궁남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정동오, 1990). 이는 초기의 단순한 풍경식 정원에서 시대가 지남에 따라 정원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의미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 신라(B.C. 57 ~ A.D. 676)
신라는 5세기 중반 불교가 도입되자, 불국사, 황룡사, 흥륜사 등 사찰이 증축되면서 사찰 내 연못이나 석등, 다보탑 석 가탑과 같은 탑 등 조경적인 요소가 증대되었다(김용기, 2004).
- - 고구려(B.C. 37 ~ A.D. 668)
-
통일신라(A.D. 676 ~ A.D. 935)
- 통일신라시대의 정원은 정교하며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정원기법이 완전히 흡수된 형태이다(이재근, 2002). 대표적인 통일신라시대의 정원인 안압지는 신선사상을 배경으로 해안풍경을 묘사한 정원이다. 포석정의 곡수거, 사절유택 등은 귀족들의 풍류를 위한 정원이며, 통일신라시대부터 최치원의 은둔생활로 별서풍습이 시작되었다.

-
고려(A.D. 918 ~ A.D.1392)
- 고려시대의 정원은 기록이 적으나, 금원(예정 8년 궁의 남서에 두화원 설치)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고려시대 궁궐 정원의 경우 강한 대비효과와 사치스러운 양식을 중심으로 중국조경기술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았다(강상욱, 2005). 한편, 사찰정원인 청평사 문수원의 경우 자연 지세의 활용이 뛰어나,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개천을 활용하여 영지로 물을 가두어 청평산 비로봉의 모습이 비추게 하였다(주남철, 2009).
 열매 채취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였던 고조선시대에서부터 건축물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공간을 어느 정도 조형적으로 조성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자연의 지세를 최대한 활용하고 최소한의 인공을 가하여 조성한 고려시대의 정원까지 살펴보았다. 생존을 위한 공간에서부터 관상을 위한 공간, 상징적인 공간까지 우리나라 정원은 조상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공간이었음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 9월 웹진에서는 조선시대에서부터 현대의 정원까지 그 변화를 살펴볼 계획이다.
열매 채취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였던 고조선시대에서부터 건축물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공간을 어느 정도 조형적으로 조성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자연의 지세를 최대한 활용하고 최소한의 인공을 가하여 조성한 고려시대의 정원까지 살펴보았다. 생존을 위한 공간에서부터 관상을 위한 공간, 상징적인 공간까지 우리나라 정원은 조상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공간이었음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 9월 웹진에서는 조선시대에서부터 현대의 정원까지 그 변화를 살펴볼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