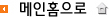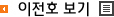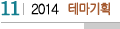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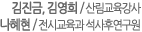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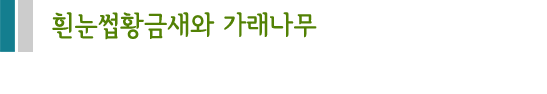
-

양의 3대 명창하면 꾀꼬리, 휘파람새, 흰눈썹황금새를 들 수 있다. 이번 51호 웹진에서는 그 중 외모가 뛰어나면서 소리까지도 아름다운 흰눈썹황금새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흰눈썹황금새 수컷의 검은색 등 깃과 황금색 가슴 깃, 큰 눈과 흰 눈썹선의 아름다운 조화는 누구라도 한번 보면 반하지 않을 수 없는 미의 극치이다. 거기에다 애잔하면서도 매혹적인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단번에 녹여버린다. 또한 흰눈썹황금새는 자기 영역을 잘 지켜내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새이다.
 수년전 여름 남한산성에서 처음 번식 장면을 지켜보던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 한창 육추중인 둥지를 관찰하고 있을 때였다. 어치가 둥지를 습격하려는지 가까이까지 다가왔다. 어치는 도토리를 좋아하지만 남의 둥지를 곧잘 습격하여 알과 어린 새끼들을 잡아먹기도 하는 잡식성의 새이다. 먼저 수컷이 밖에서 격렬하게 어치에게 대항하였고 둥지 안에서 새끼들을 보호하던 암컷까지 가세하여 육탄전을 벌여 어치를 물리쳐버렸다. 13cm의 작은 몸집으로 35cm나 되는, 자기보다 몇배나 큰 어치를 상대하여 한치도 물러서거나 위축되지 않고 둥지를 지켜낸 것이다. 소형 조류는 물론 대형 조류까지 포함하여 이렇게 자기 영역을 확실히 지켜내는 새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완전히 반하게 되었다.
수년전 여름 남한산성에서 처음 번식 장면을 지켜보던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 한창 육추중인 둥지를 관찰하고 있을 때였다. 어치가 둥지를 습격하려는지 가까이까지 다가왔다. 어치는 도토리를 좋아하지만 남의 둥지를 곧잘 습격하여 알과 어린 새끼들을 잡아먹기도 하는 잡식성의 새이다. 먼저 수컷이 밖에서 격렬하게 어치에게 대항하였고 둥지 안에서 새끼들을 보호하던 암컷까지 가세하여 육탄전을 벌여 어치를 물리쳐버렸다. 13cm의 작은 몸집으로 35cm나 되는, 자기보다 몇배나 큰 어치를 상대하여 한치도 물러서거나 위축되지 않고 둥지를 지켜낸 것이다. 소형 조류는 물론 대형 조류까지 포함하여 이렇게 자기 영역을 확실히 지켜내는 새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완전히 반하게 되었다.
흰눈썹황금새는 참새목 솔딱새과의 여름철새로 몽골 동부, 아무르, 우수리, 중국과 한국 등지에 찾아와 번식하며 번식 후 가을이 되면 인도차이나, 말레이반도, 자바, 수마트라 등 동남아로 내려가 겨울을 보낸다. 숲속이나 도심 정원의 활엽수 가지에서 생활하며 곤충과 거미류를 잡아 먹고, 때로 공중에 날아오르는 곤충을 사냥하기도 한다. 흰눈썹황금새의 영명이 Yellow-rumped Flycatcher인데 암,수 모두 노란색 허리를 하고 있어 다른 딱새류와 구분이 쉽다. 또 Flycatcher들은 공중에 날아오르는 곤충을 사냥하기에 유리하게 큰 눈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매력적이다. 수목이 울창한 숲에서는 모습보다는 소리로 먼저 만나게 되는데, 4월 하순이면 아름다운 자태와 만날 수 있다. 통상 수컷이 암컷보다 2주정도 먼저 도착하여 뒤따라 북상해 오는 암컷을 만나기 위해 세력권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자신의 위치를 암컷에게 과시한다. 도래후 일주일 쯤이면 구애와 교미를 마치고 딱따구리가 쓰던 나무구멍이나 인공둥지를 이용해 번식하는데, 주로 암컷이 둥지 짓는 일을 담당한다. 포란과 육추는 암수가 함께 하는데, 포란은 암컷이, 먹이 사냥은 수컷이 더 자주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산란은 4개정도 하고 포란은 11~12일, 육추 기간은 12일이다.
수컷에 비하여 암컷은 올리브 갈색의 등깃, 몸 아랫면은 연노란색의 수수한 외모를 하고 있는데, 새끼를 안전하게 키워내기 위한 나름의 전략일 것이다.올 6월 남해 금산에서 황금새의 번식 장면이 최초로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황금새는 흰눈썹황금새와 유사하나 눈썹선이 노랗고 봄철에 드물게 통과하는 나그네새이다. 일본에서는 흔하게 번식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봄철 외연도, 마도 등 도서지방에서나 드물게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흰눈썹황금새를 관찰한 바로는 숲 안쪽보다는 숲 가장자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목원에서는 덩굴식물원 주변과 명예의 전당 주변에서 자주 눈에 띈다.
올해는 명예의 전당 주변 가래나무에서 한 쌍이 번식에 성공했다. 딱따구리가 번식을 하고난 가래나무 죽은 줄기의 구멍이었는데, 큰오색딱따구리나 청딱따구리가 번식을 했을 법한 제법 큰 구멍에서 새끼 3마리 이상을 무사히 이소시켰다. 한동안 어미새와 함께 훈련하는 새끼들을 보는 재미에 그곳에 자주 가곤 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쌍이 찾아와 번식에 성공해서 매혹적인 소리와 자태를 보여주기를 바란다.우연히 흰눈썹황금새의 둥지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 반갑고 흥분된 마음에 새들을 관찰하느라 바빠서 미처 나무를 보지 못했는데. 며칠 후 이소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무를 살피게 되었다.
흰눈썹황금새가 둥지를 틀었던 가래나무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꽤 흔히 자라는 나무이다. 건조하고 메마른 땅보다는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곳을 좋아한다. 그렇다보니 산지 낮은 곳의 계곡 가까운 곳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 주위에 물이 흐르는 계곡이 없더라도 공중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높은 산 능선에서도 간간히 볼 수 있다. 가래나무는 키가 크고 꽃이 그다지 화려하지 않아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나 열매가 열리면 오히려 꽃이 피었을 때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나무이다. 열매는 약용 및 식용으로 사용가능해서 꽤 사랑을 받는다. 가래나무의 속명 Juglans도 열매와 관계가 있는데, Jovis glans 즉 "주피터의 견과"에서 유래되었다. 주피터는 제우스와 마찬가지로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었고, 그런 주피터의 견과라 불렸으니 견과 중에 으뜸으로 대우 받았을 것이다.
국립수목원에는 가래나무가 좋아할만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개울이 곳곳에 있다. 그 덕에 가래나무를 여기저기서 쉽 게 볼 수 있다. 가래나무는 한 그루에 암 수꽃이 따로따로 달리고, 그런 이유로 자가수분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암꽃과 수꽃이 피는 시기를 달리한다. 꽃은 수꽃이 먼저 나오는데 봄에 잎과 거의 동시에 나와서 자란다.
 바람을 이용해 꽃가루받이를 하는 가래나무도 다른 풍매화들이 가진 특징을 가졌다. 그것은 바로 수꽃을 아래로 길게 늘어뜨리는 방법이다. 바람에 잘 흔들리도록 아래로 축축 늘어진 수꽃은 잎과 같은 푸른색이다. 그렇다보니 나무에 달려 있을 때 보다 오히려 땅에 떨어져야 사람들 눈에 더 잘 띈다. 이미 시들어 떨어진 수꽃을 보고서야 고개를 들고 여기 가래나무가 있었구나 깨닫는 경우가 많다. 수꽃이 지고나면 새로 돋아난 새순 끝부분에 암꽃이 핀다.
바람을 이용해 꽃가루받이를 하는 가래나무도 다른 풍매화들이 가진 특징을 가졌다. 그것은 바로 수꽃을 아래로 길게 늘어뜨리는 방법이다. 바람에 잘 흔들리도록 아래로 축축 늘어진 수꽃은 잎과 같은 푸른색이다. 그렇다보니 나무에 달려 있을 때 보다 오히려 땅에 떨어져야 사람들 눈에 더 잘 띈다. 이미 시들어 떨어진 수꽃을 보고서야 고개를 들고 여기 가래나무가 있었구나 깨닫는 경우가 많다. 수꽃이 지고나면 새로 돋아난 새순 끝부분에 암꽃이 핀다.
암꽃은 여러 개가 모여 달리는데, 꽃이라 하지만 애초부터 열매모양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단지 자방 끝에 암술머리가 달려있는데 두 개의 빨간 암술머리가 꽤 인상적이다. 그러나 잎이 무성해진 후에 피는 암꽃에서 작고 빨간 암술머리를 찾아내기는 그다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숨은 듯이 아닌 듯이 숨바꼭질을 하며 자란 열매는 9월에서 10월쯤에 익는다. 잘 익은 열매는 저절로 땅에 떨어지는데 이때 껍질은 저절로 갈라지고 거의 흑갈색으로 변한다. 땅에 떨어진 열매의 껍질을 벗길 때는 굳이 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발로 이리저리 굴려가면서 밟으면 껍질이 쉽게 벗겨진다. 열매도 마찬가지지만 씨앗도 호두나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래나무가 보다 길쭉한 타원형이며 끝이 더 뾰족하다.
 어쩌다 간혹 하트모양을 한 씨앗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껍질에 둘러싸인 열매만으로는 씨앗이 하트모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별 생각 없이 껍질을 깠는데 하트모양의 씨앗을 만나면 참으로 신기하다. 사람이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모양을 하고 있을까. 올 가을에도 사랑의 씨앗을 품고 있는 열매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어쩌다 간혹 하트모양을 한 씨앗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껍질에 둘러싸인 열매만으로는 씨앗이 하트모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별 생각 없이 껍질을 깠는데 하트모양의 씨앗을 만나면 참으로 신기하다. 사람이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모양을 하고 있을까. 올 가을에도 사랑의 씨앗을 품고 있는 열매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가을이 되어 잎과 열매가 떨어지면 줄기와 함께 엽흔이 드러난다. 나무들의 엽흔은 동물 얼굴모양을 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래나무는 뚜렷하게 동물 얼굴모양이다. 겨울이 되면 원숭이나 오랑우탄 같기도 하고 낙타 같기도 한 엽흔을 보는 재미가 솔솔 하다.
가래나무 죽은 줄기에서 흰눈썹황금새의 둥지를 보기 전까지는 무성한 줄기와 잎을 가진 나무를 건강한 나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다. 죽은 줄기는 나무로서의 역할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나 새의 둥지로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면 이 또한 자연에서는 좋은 나무, 건강한 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